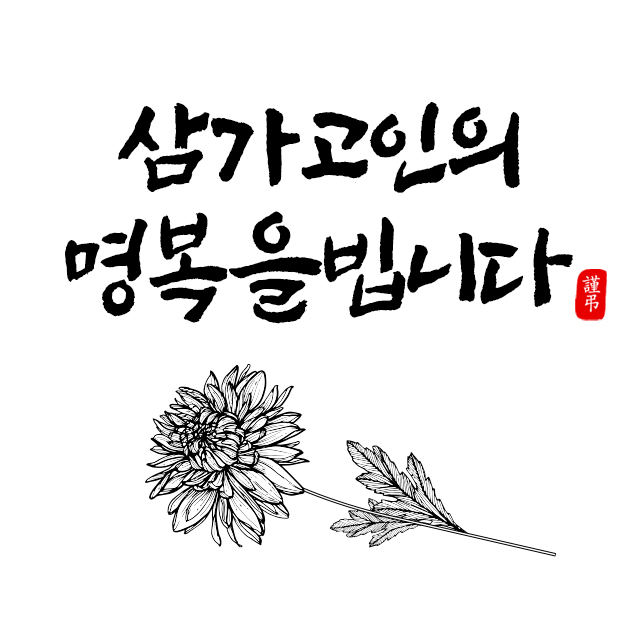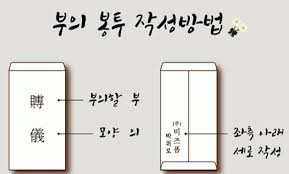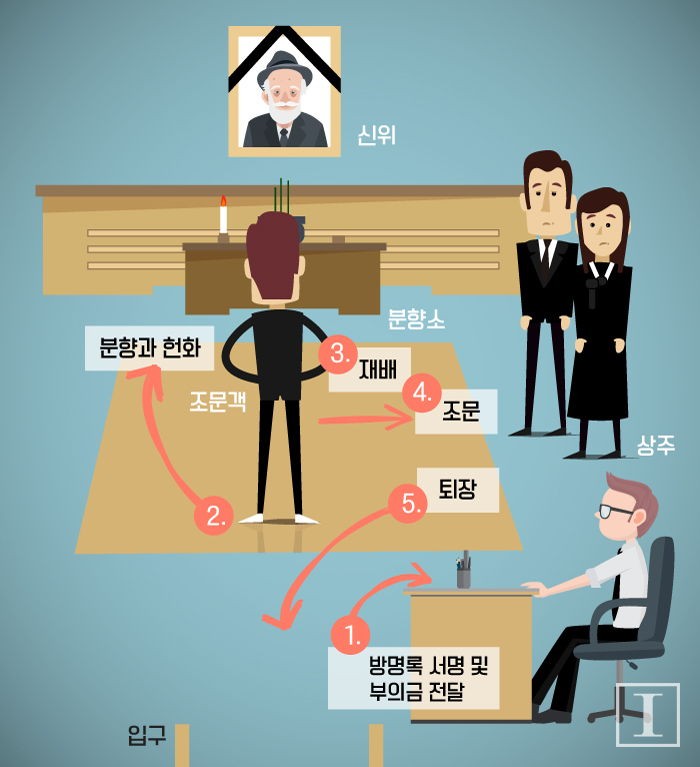전통식 장례 절차
1. 임종 (臨終) - 사람이 숨을 거두는 순간을 말하며 운명을 함께할 가족과 일가친지에게 기별하여 준비한다. 2. 수시 (收屍) - 시신의 굳기전에 정성을 다하여 몸을 바로잡는 절차이다. - 숨이 끊어지면 눈을 감기고 깨끗한 솜으로 귀, 코, 항문을 막고 몸이 굳지 않도록 손발을 고루 주물러 펴준다. - 남자는 왼손을 위로,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하여 두손을 한데 모아 한지로 묶고, 발도 가지 런히하여 한지로 묶는다. 3. 고복 (皐復) - 고복은 고인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뜻하여 행하는 절차이다. 고인의 혼을 부르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상의를 가지고 동쪽 지붕으로 올라가 옷을 휘두르며 고인의 주소와 성명을 외치고 復(돌아올 복)을“복!복!복!” 하고 복을 세번 부른다. 4. 발상 (發喪) - 아들, 딸, 며느리가 머리를 풀고 초상이 났음을 알리는 절차이다. - 상주는 죽은 사람의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으면 장손 , 장증손, 장고손 순으로 된다. 자손이 없을 시 가까운 촌수의 친지가 대신한다. - 출계(양자로간)한 아들과 출가한 딸은 머리를 풀지 않으며 비녀만 뺀다. - 상중(喪中), 기중(忌中), 이라고 써서 문밖에 붙여 알린다. 5. 전 (奠) - 죽은 사람을 생시와 같이 섬기는 의미로 음식을 차려 올리는 것을 말한다. - 전은 상주가 올려야 하지만 슬픔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상주대신 일을 주관하는 집사(執事)가 대행한다. 집사는 절을 하지 않는다. - 음식은 주과포혜 (酒果脯醯) 정도의 제물로 염습이 끝날 때까지 하루마다 교체하여 올린다. 6. 습 (襲) - 죽은 사람을 닦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염습(殮襲) 이라고 한다. - 시신를 향나무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씻기고 머리는 닦고 빗질하여 정리한다. 손톱과 발톱을 깍아 준비한 주머니에 넣고 추후 관속에 넣는다. - 수의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입힌다. 이어 시신의 입속에 구슬과 물려 주는데 이를 반함(飯含) 이라한다. 염습절차가 끝나면 시신을 이불로 덥는다. 7. 소렴 (小斂) - 소렴은 죽은 다음날 아침 시신을 옷과 이불로 싸는 절차를 말한다. - 시신을 소렴상에 눕혀 좋은 옷으로 골라 입히고 소렴금(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아래부터 묶어 올라간다. 8. 대렴 (大斂) - 대렴은 소렴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하는 절차로 소렴을 한 다음날. 즉 죽은지 삼일째 되는날에 한다. 3일째 염을 하는 것은 혹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옛 조상들의 효성 때문이다. - 대렴금(이불)로 시신을 싸고 장포와 횡포 순으로 묶고 시신을 관속에 모신다. - 생시에 빠진 이나 먼저 깎은 손톱 발톱을 담은 주머니를 관속에 같이 넣는다. - 대렴이 끝나면 병풍으로 관을 가리고 제물을 올린다. 9. 성복 (成服)- 상을 당한 뒤 초종(初終)·습(襲)·소렴(小斂)·대렴(大斂) 등을 마친 뒤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이다.- 죽은지 4일째 행하는 의식으로 날이 밝으면 혈통관계 사람들이 각각 해당 오복을 입고 제자리에 나간 후 조곡(弔哭 :곡하여 울음)을 하고 서로 조상(弔傷 : 애도하는 말) 한다. * 오복 (五服) : 초상을 당했을 때 망자(亡者)와의 혈통관계의 원근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 되는 유교의 상복제도 10. 치장 (治葬) - 장사할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필요할 도구를 제작하는 절차이다. - 옛날에는 석 달 만에 장사를 지냈는데, 이에 앞서 지날 만한 땅을 고른다. - 묏자리를 정하면 이어 장사 지낼 날짜를 잡는다. 날짜가 정해지면 산소에 산역을 시작하고 토지신에게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 11. 천구 (遷柩) - 장사 하루전에 발인을 하기위해 영구를 상여로 옮기는 의식 절차이다. - 상주 및 가족들이 참석하여 조전(祖奠 : 발인전에 영결을 고하는 제식)를 올리고 영구를 상여로 옮긴다. 12. 발인 (發靷) - 영구를 상여에 싣고 장지로 운반하는 절차이다.- 이때 견전제(遣奠祭)이라 하여 조전과 같이 제물을 올리고 축문을 읽는데 요즘은 발인제라 한다.- 축관이 술을 따라 올리고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나면 상주 이하는 모두 곡을하며 절한다. 13. 운구 (運柩)- 영구를 장리까지 운반하여 가는 것을 말한다.- 상여를 운구 중에는 상주 이하는 모두 곡하면서 뒤를 따른다.- 상여로 운구할 때 묘소에 가는 도중에 노제를 지내기도 하는데 이는 고인과 친한 조객이나 친척 중에서 스스로 음식을 준비하여 지내는 것이다. 14. 하관 (下棺) - 하관은 광중(壙中)에 관을 넣는 것을 말한다. - 하관할 대 상주들은 곡을 그치고 하관하는 것을 잘 살핀다. - 다른 물건이 광중으로 떨어지거나 영구가 비뚤어지지 않는가를 잘 살핀다. - 하관이 끝나면 관을 깨끗이 닦고 나서 구의(柩衣)와 명정을 정돈해서 한복판에 덮는다. - 축관은 상주에게 현운을 받아 광중에 들어가 관의 동쪽, 즉 죽은 사람의 왼편에 바친다. - 현훈이란 사신에게 드리는 폐백으로서 현은 검은 비단이고 훈은 붉은 비단이며 이것을 색실로 묶되 동심결로 묶는다. 15. 성분 (成墳) - 흙과 석회(石灰)로 광중을 채우고 봉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 상주의 취토 후에 관을 덮는다. - 석회와 흙을 섞고 물을 끼얹어 빨리 굳게 한다. - 평토를 한 다음 흙을 둥글게 쌓아올려 봉분을 만들고 잔디를 입힌다. - 성분때는 지석(誌石)을 묻는데, 세월이 흐르거나 천재지변으 로 허물어졌을 때 주인이 누구인지 알기 위함이다.- 제주축(祭主祝) - 일명 평토제축 ( 일명 평토제추축)- 화장시 위령제(慰靈祭)를 화장장(火葬場)에서 영좌를 모시고 간소하게 제수를 차린 뒤 고인의명복을 비는 제사를 지낸다. 16. 반곡 (反哭) - 장례가 끝난 뒤 상주 이하가 요여를 모시고 귀가하면서 곡하는 것을 말한다. - 집 대문이 보이면 다시 곡을 한다. 집사는 영좌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상주가 집에 도착 하면 축관으로 하여금 신주를 모시게 하고 신주 뒤에 혼백함을 모신다. 그러면 상주 이하가 그 앞에 나아가 슬피 곡을 한다. - 장지에서 혼백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것을 반혼이라한다. 17. 우제/삼우제(虞祭/三虞祭) - 우제란 신주(神主)를 위안시키는 제이며, 초우(初虞)는 장일(葬日) 당일 집에 돌아와 지내는 제사(祭祀)이다.- 재우(再虞)는 장일 이튿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이다. - 삼우(三憂)는 묘소(墓所)에 가서 묘의 성분(成墳)상태를 살펴보고 간소한 제수를 진설하여 제를 올린 다음 묘의 우측, 묘 앞에서 보면 좌측 약 3족 정도 앞으로 나와 10cm 깊이로 땅을 파서 혼백을 묻어 두고 돌아온다. - 이후에는 지방, 신위를 모신다.